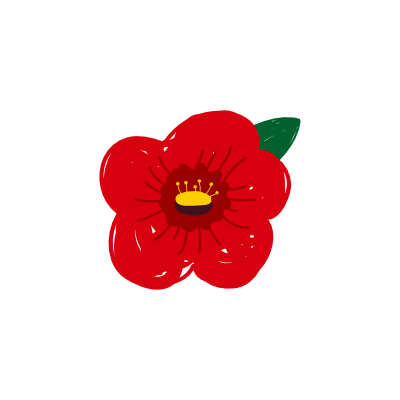“얼마나 사랑해야 우리는 끝내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4.3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통해 전한 한강 작가의 물음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심금을 흔들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제주에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작별하지 않는다’ 주 배경인 표선은 작품의 감동을 되새기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의소리]는 한강을 통해 재조명받는 표선의 아픈 역사와 다크투어 가능성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제주의소리[편집자 글]

지난 29일 ㈔제주다크투어가 진행한 ‘작별하지 않는 다크투어’ 프로그램에는 표선면 주민을 비롯해 제주 한달살이 관광객, 일본 마이니치 신문 기자 등 10여 명이 참여해 애도의 마음을 나눴다.
이 투어는 제주 4.3 사건을 다룬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의 배경이 된 곳으로 추정되는 표선면 일대 새가름, 종서물, 표선초등학교, 한모살을 따라 걸으며 진행됐다.
투어는 주인공 경하가 눈보라를 헤치며 찾아갔 인선의 엄마 정심이 살던 집 ‘P읍 세천리 한지내’를 떠올리며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소설 속 인물들이 겪었을 고통과 상처를 떠올리며, 지금은 잊힌 듯한 마을의 흔적을 하나씩 되짚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인선의 아버지가 살던 마을과 인선의 집이 있던 배경으로 추정되는 ‘새가름’.
한때 20여 가구, 100여 명의 주민들이 터전을 이루며 살았던 마을이지만 1948년 11월 15일 토벌대의 불길이 마을을 삼켜 버렸다.
마을은 잿더미로 변했고, 17명이 ‘버들못’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총 25명의 주민이 희생됐다.
지금 이곳에는 세찬 바람만이 휘몰아칠 뿐이었다. 잊혀진 듯한 공간 속 새가름 표석만이 마을의 비극을 증언하고 있었다.
표석을 지나 마을 안길로 들어서니 한때 집터였을 작은 대나무밭이 눈에 들어왔다. 잃어버린 마을의 흔적을 간직한 대나무들은 바람에 맞춰 흔들렸다.
참가자들은 조용히 대나무밭을 바라봤다. 푸른 잎들이 흔들릴 때마다 오래전 잃어버린 목소리들이 들려오는 듯했다.
경하가 인선의 집으로 가기 위해 기다렸던 버스정류장을 지나 표선초등학교에 도착했다. 표선초는 4.3 당시 주민들의 수용소로 사용된 곳이다.
지금은 아이들이 뛰노는 잔디 운동장과 놀이기구가 자리 잡고 있지만, 그곳에서 70여년 전 벌어졌던 비극은 여전히 그 땅에 깊이 새겨져 있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48년 12월15일 군인들은 마을 주민들을 수용소로 이끌고 18세에서 40세 사이의 남성들을 분리한 뒤 여성들 중 젊고 예쁜 이들을 따로 분리하여 표선국민학교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이들은 총살당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비극도 있었다. 1950년 7월 군경이 버린 포탄을 아이들이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수십 명의 학생이 사상당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숨겨져 오다가 2015년이 되어서야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탑이 세워지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참가자들은 참혹함에 잠시 말을 잃었다.
다음으로 발길을 옮긴 한모살은 ‘당캐’, ‘표선백사장’으로도 불리는 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진 표선면 바닷가다. 책 표지와도 닮은 이곳은 4.3 당시 표선면, 남원면 일대 주민들의 학살터였다.
지금은 표선민속촌과 표선면도서관이 들어섰지만, 대규모 학살이 일어났던 도서관 입구 공터는 여전히 황량한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다.
제주4.3유적지임을 알리는 작은 안내표지판이 놓여 있었고, 누군가 가져다 놓은 백합이 그 앞에 자리하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바닷가에서 희생자들이 총살당한 장면을 묘사한 소설의 구절을 함께 읽었다. 낭독을 마친 참가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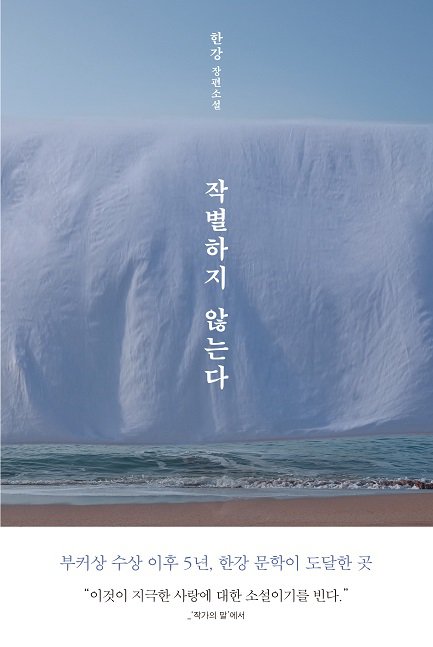
‘어둑어둑해지는데 총소리가 멈춰서 문구멍으로 내다봤더니 피투성이로 모래밭에 엎어져 있는 사람들을 군인들이 바다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옷가지 한 장 신발 한짝도 없었어요. 총살했던 자리는 밤사이 썰물에 쓸려가서 핏자국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모래밭에서 죽였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225p)’- 한강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투어의 마지막 목적지는 374기 유해를 모신 제주4.3평화공원 봉안관.
정심이 4.3 당시 헤어진 오빠가 묻혀 있을 것이라 여겼던 제주비행장(정뜨르비행장) 유해 발굴 현장이 재현돼 있었다. 1948년 12월부터 1949년까지,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까지 이어진 학살의 현장은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아픔으로 남아있었다.
‘그들의 얼굴에 쌓였던 눈과 지금 내 손에 묻은 눈이 같은 것이 아니란 법이 없다’는 작별하지 않는다의 한 구절처럼, 참가자들은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며 그 아픔이 여전히 현재와 이어져 있음을 깨달았다.
이주민 백모씨는 “10년 동안 제주에 살았지만, 4.3 추념일이 다가올 때마다 ‘왜 과거를 놓지 못할까’, ‘그저 지나간 일로 묻어두면 안 될까’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으면서 달라지는 울림을 느꼈다. 아직 4.3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왜 4월이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조금씩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유튜버 데이지헐은 “다크투어가 아니었다면 무심코 지나칠 뻔한 곳들이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침묵 속에 묻혀있던 진실들이었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이제는 우리가 그 묻힌 진실을 찾아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호리야마 아키코 마이니치신문 기자는 “일본 기자로서 제주 4.3의 깊은 아픔을 일본에도 전하고 싶어서, 더 알아보려고 제주에 왔다. 4.3의 해결을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보상 문제를 언급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애도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다. 이번 다크투어는 남겨진 이들이 죽은 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해 줬다”고 소감을 남겼다.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강연에서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 다크투어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