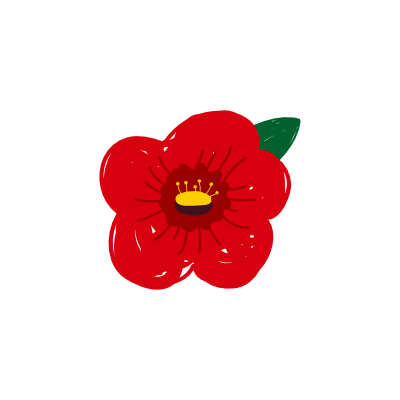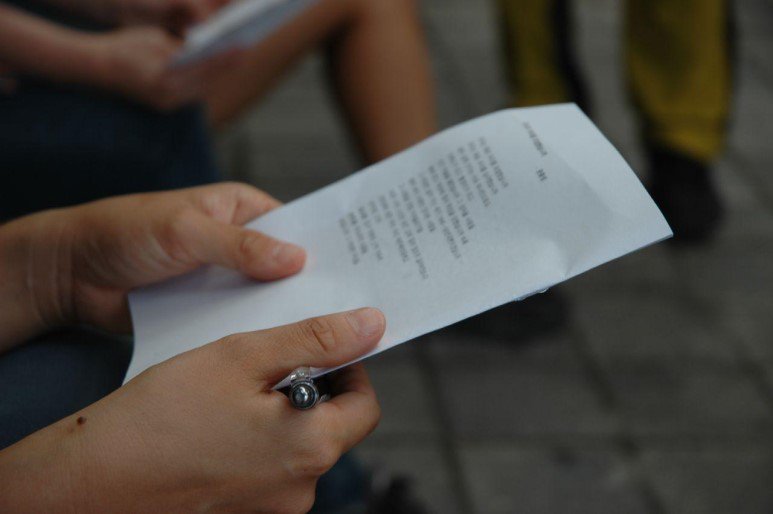
역사책에는 다 담기지 못한 이야기들이 문학 속에 있었습니다.
지난 8월의 마지막 토요일, 관덕정 앞에서 모여서 제주시내 원도심 문학기행을 시작했습니다.
김석범, 현기영, 김수열, 김경훈, 문충성 등 문인들의 작품 속 구절을 들고 그때 그 공간을 찾아가보았습니다.

관덕정 광장에 읍민이 운집한 가운데 전시된 그의 주검은 카키색 허름한 일본군 차림의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집행인의 실수였는지 장난이었는지 그 시신이 예수 수난의 상징인 십자가에 높이 올려져 있었다. 그 순교의 상징 때문에 더욱 그랬던지 구경하는 어른들의 표정은 만감이 교차하는 듯 심란해 보였다. 두 팔을 벌린 채 옆으로 기울어진 얼굴. 한쪽 입귀에서 흘러내리다 만 핏물 줄기가 엉겨 있었지만 표정은 잠자는 듯 평온했다. 그리고 집행인이 앞가슴 주머니에 일부러 꽂아놓은 숟가락 하나, 그 숟가락이 시신을 조롱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보고 웃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하여 그날의 십자가와 함께 순교의 마지막 잔영만을 남긴 채 신화는 끝이 났다. 민중 속에서 장두가 태어나고 장두를 앞세워 관권의 불의에 저항하던 섬 공동체의 오랜 전통, 그 신화의 세계는 그날로 영영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 출정은,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다가 폭도, 역도의 이름으로 학살당한 그들의 선배들과의 영원한 결별을 뜻했다. 그 모순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가슴마다 태극기를 말아 두른, 비장한 모습의 출정 행렬들, 그들이 섬을 떠나던 날, 읍내를 온통 흔들어놓았던 그 우렁찬 함성과 합창 소리를 나는 잊지 못한다.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온 섬사람들의 집단 피해의식을 뚫고 솟구쳐 오른 큰 외침, 그랬다. 두려움으로 얼어붙은 입을 뗄 수 있는 길이라곤 오직 목숨을 건 출정밖에 없었다.- - 현기영, <지상에 숟가락 하나>
4·3 이전에도 끊임없이 수탈과 착취를 겪어야했던 제주. 그에 맞물려 저항의 역사도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 마지막 장두의 역사로 기억되는 무장대의 2대 사령관이었던 이덕구의 시신을 토벌대가 전시하고 공포를 조성하던 이야기가 <지상에 숟가락 하나>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큰 집회나 사건이 있었던 관덕정 광장은 지난 제주역사의 주요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장두의 역사가 드리워진 그 곳은 제주청년들이 전쟁에 참전하려고 모인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가권력이 덧씌운 '빨갱이', '빨갱이 가족'이라는 굴레. 그 지독했던 레드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지워지지 않는 국가폭력을 벗어던지려고 역설적이게도 국가를 위해 나서야 했던 이야기.
역사책의 서술 사이의 행간이 문학작품들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토벌했습니까
- 문충성
우리는 때로 우리를 토벌했습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를 습격했습니까
제주 섬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산폭도가 되고 빨갱이가 되고
산간 마을들 불탔습니까 그 섬마을 사람들
총에 맞고 죽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까 비록
그 비참한 삶이 지난 세기 1940-50년대뿐이겠습니까
제주 바다 수평선 건너온 사람들
그 사람들 핏빛 이데올로기들
10대 나의 소년은 낯선 겁에 질려 말조차 잃어버렸습니다.
2연대에 내준 아아, 우리 제주북초등학교
관덕정 근처
칠성통 입구 헌병대 근처 아득히
봉홧불 타오르던 오름들
보입니까 그 처참한 주검들
문충성 시인의 시 '우리가 우리를 토벌했습니까'를 읽으면서 국민과 비국민을 가르고, '빨갱이'와 민간인을 나누고, 중앙과 지역 등 끊임없이 분리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며 지배해온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오래 전 신문광고에 실린 약도로만 남은 사회과학서점들 터에도 가보고, 송악산 군사기지화 반대 집회가 크게 열렸던 중앙로 사진을 보며 걸었습니다.

탑동 매립 전에는 아름다운 바닷가였을 자리에서 바다내음만 맡으며 삼도동 전 잠수회 회장 강달인 님의 탑동매립반대투쟁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지붕이며 엔진 덮개, 유리창까지 온통 먼지를 뒤집어쓴 버스는 낮게 늘어선 집들 사이를 천천히 나아갔다. 길 가던 사람들이 차를 피해 한쪽으로 비켜섰다. 이윽고 오른쪽으로 늘어선 집들이 길모퉁이의 이발소에서 끊기자 갑자기 넓은 광장이 펼쳐졌다. 하지만 신작로는 왼쪽으로 늘어선 집들을 따라 서쪽을 향해 일직선으로 뻗어 있다. 오른쪽 길모퉁이에 있는 이발소 근처에 신작로와 직각으로 교차되는 길이 나 있었고, 왼쪽으로 나 있는 완만한 오르막길이 남문길이었다. 오른쪽으로 난 길은 광장을 지나 바다로 통했다. 그 길과 신작로 사이에 방금 건너온 하천 쪽으로 통하는 C길이 있다. 모퉁이에 자리한 삼각형 모양의 이발소는 신작로와 광장, 그리고 상점이 밀집해 있는 C길과 면해 있어서 눈에 잘 띄었다. 시장에 가려면 버스를 내려 신작로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지름길이지만, C길을 통해서도 갈 수 있었다. 광장 뒤편 소나무 숲을 배경으로 공자사당 풍의 붉은 단청이 벗겨져 거무스름해진 관덕정(觀德亭) 건물이 부드럽게 휘어진 추녀를 흐린 하늘에 펼친 채 서 있었다. 신작로 오른쪽에 펼쳐진 광장의 모습이 남승지의 시야에 한눈에 들어왔다. 관덕정을 사이에 두고 신작로와 평행한 길이 또 하나 뻗어 있었다. 그 길과 광장에 인접하여 여러 관청과 경찰서가 늘어서 있었는데, 모두 1, 2층짜리 건물들로,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관덕정 건물이 아직껏 주변을 압도하며 당당하게 서 있었다.- - 김석범, <화산도>
문학박사 김동현 님의 해설로 진행된 이번 원도심 문학기행에는 제주에서 문화기획을 공부하고 실행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했습니다.
도심 속에 간신히 남아있는 올레길을 발견하고 함께 감탄하면서 오래 전에 끝난 것처럼 멀게 느껴지던 역사가 현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걸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